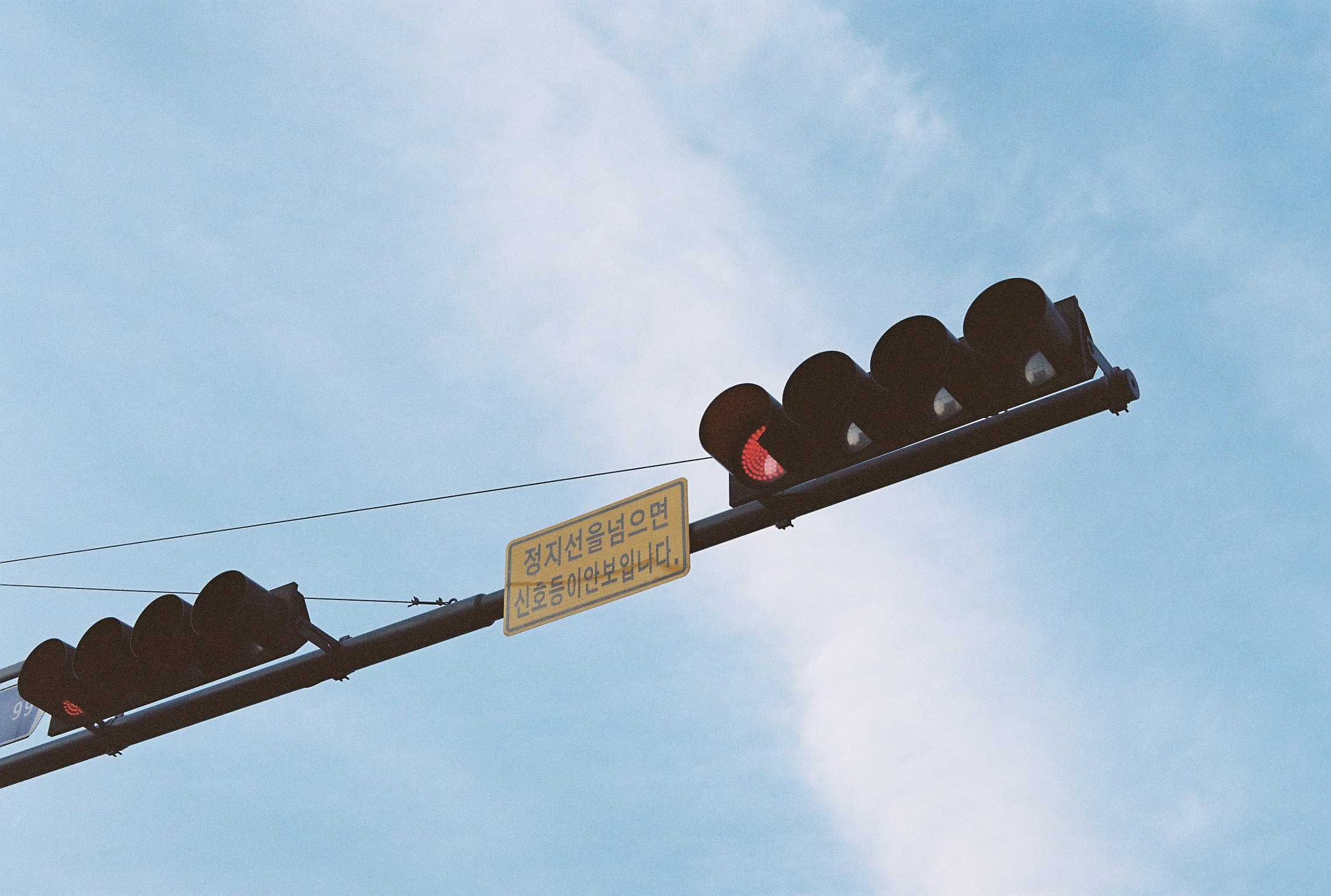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흔히 나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사랑에 관하여 낭만을 꿈꾼다. 모든 부분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내 꿈과 이상의 세계, 연약하고 여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좋겠고, 나의 상처가 유별난 일이 되지 않게 그저 아픔을 알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바란다.
같은 위로를 해도 누가 하면 가벼운 빈말에 지나지 않는 반면,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네는 위로는 마음을 울리곤 한다. 나도 너와 같다는, 고통을 굳이 헤아리려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눈을 마주치고 고개 한 번 끄덕이면 서로 아무 말도 필요 없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가지고 싶다.
남들에게는 잘 말하고 다니지 않는 소박하고 부끄러운 꿈 같은게 있다. 다소 마이너한 취향도 있다. 자주 무시되곤 하지만 나만은 꼭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들도 있다. 꾹꾹 눌러왔던 상처들도 있다. 어느 때가 오면 마음 속에 빛나는 것들을 저 끝도 없는 밤하늘에 수놓고서 조심스럽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나도 몰랐던 나의 것들을 발견해주고 빛내주는 사랑, 내가 온전히 나다울 수 있게 해주는 사랑,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하는 사랑. 사랑받고 온전히 이해받으면서 그 안도감에 모든걸 내려놓고 취하고 싶다. 어찌 보면 삶은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면서, 이런 나를 알아줄 사람을 찾아 떠나는 모험인 것 같다.
내가 사랑에 거는 이러한 기대는 오직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만 부여된다. 힘든 얼굴로 집에 가는 길에 들른 식당에서 사장님이 나를 보고 안부를 묻지 않아도 딱히 서운하지 않다. 하지만 지친 하루 끝에 만난 연인이 무심하다면 나도 모르게 한껏 부풀었던 기대가 깨지게 된다.
연인이라서,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내 삶의 의문들에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내 고독에 말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기대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그런 존재론적 평화와 안도감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나”는 “너”에게 바라는게 많은 사람이다. 수많은 다른 점을 가진 “너”에게, 그럼에도 “나”와는 가장 깊은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이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은 혼자다 라고 되뇌이면서도 결국에는 “나”의 의문들과 고독의 극복을 “너”에게 떠넘기고야 마는 것이다.
당연히도 소망 뒤에는 좌절이 따라붙는다. “너”를 사랑하는 무수한 이유들을 제쳐두고서라도 아주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도 틀어지는 것이 “너”와 “나”의 관계이다. 시간과 믿음이 쌓이기도 전에 기대와 실망이 “우리” 사이를 관통한 자리에 홀로 주저않아 체념하기를 무수히 반복했다. 그곳에 남은 것은 하나의 처절한 진실뿐이다. 사람을 낙원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것.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네”가 “나”의 낙원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라는 낙원에서 모든 고민과 삶의 채무가 해결된 채로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설명할 필요 없이 해명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평생을 쏟아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낙원을 찾아 왔다. 오늘도, 지금도, 익숙한 듯 좌절을 겪는다. 그렇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을 때, 매번 다시 일어나 절뚝거리면서 걸어왔던 내가 참 신기하고 한심스럽다. 오늘은 체념과 고독을 가득 삼켜 배탈이 나 있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눈이 반짝거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굴레에 갇혀 있다. 언제까지 사람과 사랑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언제즈음 쓰러질까?
댓글